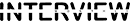눈썰미가 좋으면 물고기의 힘줄과 혈관만 봐도 자연산인지, 가두리에 타협한 양식산인지 대번에 안다. 미술의 아카데믹함도 그러하다. 안락하고 무난한 화구 속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유리하지만, 날선 작가적 열망으로 물살을 가르는 창작의 지느러미를 등가교환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이다. 올해, 이우섭 화가의 공식 1호 개인전은 42년간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창조공간 안에서 살아온 그가 취미였던 그림 ‘부캐’에 화백의 예명 ‘이우섭’을 지어 ‘본캐’로 끌어올린 출사표로 호평 받았다. 진취적으로 다이빙하는 그의 소통법은, 붓 터치 대신 드리핑에 자신의 감각을 주입한 시리즈 ‘흔적(Trace)’의 성과로 남았다. 타협을 거부하며 자유로운 소신을 보여준 이 화가가 캔버스를 매개로 세상의 문을 연타한 흔적인 그의 작품들은, 전에 없던 새로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반짝이는 윤슬처럼 영롱하고 신선한 감성을 선사한다.
군집된 점의 트래킹, 마치 윤슬처럼 드리핑한 점묘 유닛으로
나이는 팔순, 그러나 목소리는 18세 청년처럼 힘이 넘친다. 평생외길인생도, 늦깎이 대기만성이나 은둔고수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개척정신이 보인다. 생업 은퇴 4년 차지만 “남의 그림 모작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는 은사의 충고를 새기고 오래도록 숙성한 기백으로 연이어 미전에 입선했던 이우섭 화가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사동 갤러리이즈에서 첫 개인전을 성황리에 치렀다. 모델하우스 로비처럼 편안하고 인테리어숍처럼 따뜻하지만 창작공간이라는 전시회의 본질을 지킨 이 개인전은 2017년 42년간의 인테리어건축디자인 분야를 정리하고 ‘흔적(Trace)’의 다양한 모습을 시도한 이 화가의 데뷔전이다. 기존 화단을 답습하느니 이단이 되길 바란 그는, 푸른 바다 은빛윤슬의 궤적처럼 찬란히 흩뿌려진 점묘 <Trace 018>, 우연성과 겹침 효과를 태양의 홍염처럼 강렬하게 표현한 <Trace 011>, 군청톤 아크릴의 맑고 되직한 질감이 생생한 <Trace 022>, <Here&There> 시리즈의 공감각적 색면 영역구성처럼 감각적인 20점의 작품을 소개했다.
“번역이 반역이듯, 붓을 든 답습은 형편없는 색칠놀이다. 기본기만 다진다면 누구든 화구에 얽매이지 않고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도 예술가의 영혼을 그려낸다”에 적합한 유형의 예술가인 그는 묵직한 붓의 결보다 중력을 벗어나 크기와 색감으로 찰랑이는 점묘의 어필을 택했다. 미니멀의 의미부여 이전에 내면의 단련과 물감의 연타를 거치는 이 화가의 작법은 여운과 잠식, 아이 같은 직관과 노인의 성찰을 겸비하며, 그의 손에 새겨진 물감냄새와 깊이로 캔버스를 트래킹하며 창작의 영토 위를 화통한 자유분방함과 연륜의 열정으로 뒤덮는다.
힘의 낙차가 만든 흔적에 양식화 대신 개성화의 자유분방함 담다
개성중학교 시절 은사 김종식 선생의 충고에 감화되어, 이후로도 ‘인사동미술’로 표현되는 정통화단을 등지고 새로운 기법에 도전하며 자신의 창조성을 시험대 위에 올리는 이 화가는, “그림은 복잡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감성(Feeling)이다. 인사말 주례사보다는 디스플레이같은 그림,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좋다”라고 한다. 때로 현대미술의 도슨트가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처럼 감상의 필수요소가 되는 모순에, 그는 “베토벤의 악보에 삽화를 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음악에 소리가 아닌 실체가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심금을 울리던가. 미술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자신의 그림을 길게 설명하는 이들은 수필가가 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응수한다.
이 화가가 생각하는 예술에서의 단순성도 마찬가지다. 캔버스를 세워두고 가차 없이 흩뿌리는 잭슨 폴락의 푸어링과 액션 페인팅 대신, 그는 오랜 세월 답습되며 양식화된 기법이 아닌 수성페인트 위의 드리핑처럼 우연과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작업으로 개성적 화풍을 다듬어 갔다. 어떠한 주류도 유행도 따르지 않은 그만의 이 그림들은, 생업이었던 SUBI DESIGN에서 화가로 캐릭터를 바꾼 그가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가죽소파들의 유니크함이 가구의 탈을 벗고 캔버스에 오름을 입증하듯 세련된 철학을 지녔다. 말로 설명하기 이전에 그림이라는 본질적인 색의 구조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의 호기심 어린 창조성이 힘의 낙차가 되어 캔버스를 두드릴 때 생긴 흔적들은 붓질보다도 강력한 이야기들을 내리 꽂는다.
인간의 첫 번째 소리가 배워서 내기보단 때가 되면 내는 소리이듯
<Trace>는 그 흔한 정물이나 화려한 치장도 없이, 물감과 캔버스 앞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점과 색의 궤적을 찍어 온 이 화가의 직관과 의지로 굳건하다. 그는 학원 도제식과 그림 인큐베이터 방식을 ‘자기복제’라 칭하며 꿋꿋이 반대해온 소신을 입증하듯, 동명의 예술가가 있는 본명 대신 옥돌 우(玗)가 들어 있는 이름으로 전시를 열고, 어떤 디스플레이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도 화구를 액자에 짜 넣지 않았다고 한다. “본디 고운 얼굴엔 굳이 화장으로 덮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처럼 미사여구 대신 직관을 택한 그는 경기미전과 인천미전에 입상하는 즐거움 속에, 때론 그림이 거꾸로 걸리거나 전시 중 흠집이 나는 사건조차 험난한 개척의 여정 속에 자신을 각성시키는 자양분으로 여겼다. 수천수만의 전시를 오간 갤러리관객 시절의 내공과 안목으로, 자신의 그림을 거칠지만 생기 넘치는 원석으로 만든 그는 자신의 그림에 담긴 에너지가 늘 ‘자연산’이길 바란다.
마치 인간의 제일성(第一聲)이 완벽한 성량이라서가 아니라 때가 되어 세상에 나왔음을 알리는 소리라서 가치가 있듯이. 이 화가는 정해진 레슨에 갇히느니 화실 칠판에 떠나는 이유를 적고 창조자가 되길 택했다. 따라서 80대의 미술 레지스탕스인 그의 모험은, 가장 어린 이들이 진취적이라는 편견을 깨고 보편성과 개척정신을 매우 스타일리시하게 조화시킨다. “격식으로 채운 그림보다 어쩐지 마음에 드는 새로운 그림”을 외치는, 가두리를 벗어난 물 만난 고기 같은 그의 감성은 관객들에게도 강태공의 눈빛을 지니게 만든다. 이 화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보여준 그의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은 관객들 앞에서 “확고한 어조의 신작을 꾸준히 그려 매년 1-2회씩 개인전에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힘주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