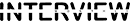[월간인터뷰] 정재헌 기자 = 역성혁명을 조선 개국으로 잇고자 “만수산 드렁칡처럼 얽히자”고 제안한 이성계 부자에게 “가슴을 뚫어 새끼줄로 꿰고 얽으라”며 거절한 변안렬의 일화처럼, 네트워크라는 통신의 그물에 얽힌 세계 온라인 유저들처럼, 동서고금의 인간사는 맺고 엮는 관계로 자라는 자연계에 빗대지곤 한다. 모두가 유기적으로 얽히며 섞이는 인간관계와 닮은 나무의 잔가지를 모티브로,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을 풀어 나간 화가, 김은진 작가는 <Shadow>연작으로 나무와 빛을 전제로 한 그림자의 실체, 그리고 그림자 안의 그림자를 암시한 데 이어 <뒤집힌 시간>으로 주체와 객체 간의 관점을 보여 왔다. 지난해부터는 얽히고 뒤엉킨 유기적 관계를 성찰하며 ‘벽’의 실체에 관한 질문을 남긴다. 과연 벽은 소통을 단절하는 공간인가, 혹은 보호하는 울타리와 나만의 공간인가. 이 흥미로운 관계성에 대해 김 작가의 의견을 들어 본다.

빛과 그림자와 나무를 지나 얽혀진 인간의 이면, 그리고 벽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생긴 의미들
지난 13년 간 인간과 나무, 그 사이의 빛과 이면에 나타난 그림자의 변화로 개체의 관계성과 은유를 시도한 김은진 작가의 이론은 현상학적 방법론에 포커스를 두면서 완성되어 왔다. 그리고 김 작가의 주된 소재인 ‘나무’는 인간의 생애주기를 따르는 생로병사의 흐름, 그리고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 이론을 바탕으로 인용된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인식의 첫 번째 주체인 동시에 대상화작업이 가능한 소재인 인간의 몸을 다루고, 주변의 유기체들과 어떠한 관계로 존재하는지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3년 전 개인전 <The Moment>에서 나무를 비추는 다양한 빛을 통해, 또 조명을 받아 빛나는 나무 뒤에서 그 빛이 존재해야 실체를 드러내는 그림자로 나무의 주체와 객체 개념을 뒤집은 김 작가의 작품은 수학적 명제로 접근할수록 더욱 흥미롭다. ‘나무와 빛이 없다면 나무그림자는 없다(참). 나무그림자가 없다면 거기에는 나무도 빛도 없다(역), 나무와 빛이 있으면 나무그림자가 생긴다(이). 나무그림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나무와 빛이 있다(대우)’라는 4가지 전제를 나무와 빛의 관계성으로 해석할 때, 수학적 논리라면 참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역과 이의 영역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따라 그 ‘측면에 숨겨진 넓이’가 전제되면서 모두 참된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이는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이기에, ‘실제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이드미러, 맑은 물의 수심이 얕아 보이는 착시는 반대로 나무와 빛, 이들이 결합해 반대쪽에 영사되는 실제보다 긴 그림자의 관계가 만드는 착시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두 눈으로 사물의 넓이와 깊이감을 구분하는 인간으로서, 김 작가는 이들 나무, 빛, 그림자의 관계성과 존재감, 거리감을 작가 자신, 사물, 사물의 깊이라는 관계로 대입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빛과 나무에 동시에 종속되어 있는 나무그림자는 그림자인가? 아니면 나무인가?”라는 질문과 추론이 시작된다. 따라서 김 작가는 우리 인간들의 만남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공존하듯이, 가지를 뻗은 나무와 나무끼리 엉켜져서 나무들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나가 되는 점에 주목해 이들의 관계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림자와 나무는 그렇게 벽이라는 새로운 스크린에 영사되는 새로운 관계성을 시작한 것이다. 자연 이미지를 모티브로 인간의 이면을 작업하고, 이면 속의 이면을 드러낸 김 작가는 기존의 나무를 바탕으로 벽이 지닌 중의적인 의미인 단절과 보호에 작가의 의도를 투영(投影)함과 동시에, 스크린의 영사에 빗댄 벽의 이미지를 투영(投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완성되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김 작가의 작품 <겹쳐진 시간>은 나무와 나무가 뒤엉켜 인간들의 시간이 엉킨 것을 은유하고 있다. 나무의 이미지를 재조합해 그간의 복잡한 심경을 그림으로 나타내며 스스로 치유의 시간을 가진 김 작가는 나무 자체의 외관보다는 실체인 벽이 의미하는 고독한 단절, 그리고 이 단절로 인해 가려져서 생기는 나만의 공간과 안정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비롯해, 인간관계가 나타내는 상징성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또 김 작가는 붓질에도 우연성 요소와 물리적 힘이 필요한 임패스토를 자제하고 동일한 붓터치를 반복하여 치유에 도달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자연의 ‘아우라’와 인간관계를 표현하고자 100호 대작의 스케일을 선택하고 있다.

김 작가는 지난 1년간 이러한 심경을 담은 최근작 10여 점의 변화를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삼청동 갤러리도스 신관 1층에서 열리는 개인전 <Shadow_흔들리는 시선>에서 선보인다. 그리고 그림자의 이면에서 분화되고 전이되는 새로운 상징성의 탄생을 지난해부터 예견했듯이, 김 작가는 이번에도 올 가을 시작하게 될 모티브들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보였다. 앞으로는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그리듯 밑그림을 그리는 행위 대신 실제로 사유하고 사색한 감정을 표현하는 드로잉을 많이 시도한 뒤 이를 채색해서 완성하는, 일종의 틀을 벗어난 작품이 될 것이다. 또 이 자유로운 드로잉을 올해 시도한 벽과 나무, 인간의 관계성과 병행하여 새로운 부류의 예술 형태를 보이겠다는 의미다. 김 작가의 철학적인 사고는 관계성이라는 어려운 주제에서 출발하지만, 오랜 숙고를 거쳐 작가 자신이 그러했듯 자연의 힘을 빌려 치유되고 온건한 결론으로 다가오기에 대중들은 김 작가의 작품에서 평온한 치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2019년 6월 17일부터 24일 안국동 사이아트스페이스로 예정된 개인전에서는 오는 10월 개인전이 끝나는 대로 벽을 마주하며 모호한 전체가 아닌, 더욱 유기적으로 얽힌 관계를 파악한 결과물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