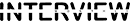인위적인 공간은 시간이 흐르고 사람의 흔적이 스쳐갈수록 변해 간다. 자연풍경을 넘어 사람이 만든 도심과 거리의 세월을 기록한 풍경 구상화가, 양종석 화가의 지난 5월 개인전 <서울실경展>에는 그의 마음의 고향 인사동이 풍경화와 인물화로 구분되던 시대부터, 그가 서울 곳곳을 누벼 만든 서정적인 로드뷰가 담겨 있다. 그는 아카데믹하고 정석적인 스펙을 지닌 화가로서 자신의 경력에 안주하지 않고, 사람들의 바쁜 걸음걸이 속에서 퇴색되거나 개조되는 건물로 사계의 흐름을 표현한 ‘풍경의 초상’ 개척화가이다. 양 작가의 풍경이 펜터치와 목탄 채색화로 서서히 바뀌는 동안, 그의 중앙소실점 구도에는 마치 로드뷰처럼 사람들의 이어폰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고, 입가의 미소에는 마스크가 씌워진 우리 일상의 변화도 담겼다.
멈추어 선 사람에게만 보이는 서사의 색채, 아날로그적 도시의 실경화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린 양종석 화가의 <서울실경展>은 근현대 미술의 희로애락을 기억하는 인사동으로부터 시작된 21세기 현대의 기록전이다. 이는 모던 보이와 골동품점과 필방이 공존한 이래, 문화도시 인사동이 남긴 값진 유산이기도 하다. 1970년대 화방과 화랑이 자리하면서 붐비기 시작해 가장 한국적인 고전 미술관광도시에 머물러 있던 인사동도, IMF와 2000년대 들어 성행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미술정신의 상징이자 임대업종의 흥망성쇠를 입증하는 지표로도 공존하게 됐다. 이런 공존의 모색 속에서 화가들의 시선도 언제까지나 이젤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었기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이브갤러리 관장이자 학원장으로 활동한 양종석 화가는 화구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서울예고와 홍익대, 동 대학원 출신으로서 미술인의 정해진 길을 걷던 그가 몽마르뜨의 무명 화가처럼 소박하게 시작한 이 도전은, 그가 추상유화로부터 풍경수채화로 돌아오면서 매력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가 자신이 그리는 수채화처럼 투명한 눈으로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서부터, 그의 시선도 자연의 섭리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교외의 사계 풍경으로부터 바쁜 일상 속의 사람들 발걸음을 좇아 기록하는 경로변경에 들어선 것이다. 그가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선택한 장소에 멈추어 서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흘러갔고 마치 크로키를 하듯 바빠진 화가의 손은 세상 곳곳의 면면을 구도로, 원근으로, 명암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갔다. 그렇게 풍경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양종석 화가의 서울도시 실경들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기억이 박제보다 복합적인 온기를 간직한 추억임을 보여준다. 그의 이동 경로들은 인사동을 지나 서울역과 이문동, 한강변과 용비교를 거쳐, 옷차림과 간판에서 풍기는 사람 냄새와 21세기 서울의 공기처럼 손에 넣기 어려운 추억들을 사진첩에 넣듯 소중히 간직해 냈다.
붓이 가는대로 기억되는 흔적, 서울의 거리로 써낸 다채로운 비망록
작가의 상상력으로 몽환적 이상을 나타낸 수백 년 전의 수채화들처럼 양 작가도 때로는 광활한 자연의 풍경을 그리지만, <한강변>이 그러하듯 파노라마 기능처럼 적절한 필터를 거친 현대인인 그의 풍경일러스트도 적절한 재구성(데포르마시옹)을 차용하고 있다. 여기도 사람이 숨 쉬는 곳임을 절박하게 알리는 할렘가의 수채화와는 달리, 일기나 비망록처럼 ‘시간의 서사’가 강한 그의 도시풍경은 완행열차를 타고 천천히 창밖을 구경하는 느낌도 든다. 10호 내외의 그림에서도 번짐보다는 터치를 추구하고, 생략보다는 과감하게 사이드에 박힌 간판 글씨까지 또렷이 써 내려간 그의 화집에는 가느단 전봇대와 거기 기댄 작은 가로수도 웅장한 기왓장과 거목처럼 여전히 드높은 존재감을 보인다. 칠이 다 벗겨져 퇴색된 외벽도, 그의 시야에 들어오면 현대 문물의 주춧돌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 그가 나타내는 서울의 일상에서 따뜻한 사람잔향이 존재하는 것은 비단 그의 풍경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다.
“보이는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기교보다 정서적인 표현을 중시한다”는 신항섭 평론가의 말처럼, 그는 점점 스케치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깊은 채색으로 덮인 요즘 한국 수채화 화단과 흐름을 달리한다. 그의 특징은 조형적 기교 배제에서 오는 순수미이며, 그의 주제의식도 초기 수채와 유화가 공존하는 과도기 시절보다는 밑그림이 보일 정도로 순수한 최근의 담채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 간 폭우와 영하 20도의 혹한이 아니면 기꺼이 화구를 들고 나가던 그의 ‘그림 비망록’도, 미세먼지와 코로나가 교대로 덮친 일상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약간의 시간적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연신 들이키던 출근길 사람들의 입가가 마스크로 굳건하게 덮여 있어도, 퇴근길이면 으레 강변에 보이던 러닝사이클족 귓가의 이어폰 두 줄이 점점 사라져가도, 그의 붓이 가는대로 나타나는 서울의 풍경들은 마치 뉴욕 센트럴시티 어딘가를 보는 듯 담백하고 운치 있어 보인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어도 눈빛으로 숨겨진 입모양을 대신하는 요즘, 옆모습과 뒷모습이 더 많았던 그의 그림에서는 익명성의 상징인 마스크 덕분에 사람들의 얼굴도 이제 측면에 가까운 정면으로 스쳐 지나간다. 마치, 박람회나 놀이공원이 마냥 그립던 지난 해 우리의 마음을 살포시 위로해 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