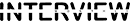책 속에 기록된 글자들은 시공을 초월해 인간의 지식과 생각을 전하는 언어들이다. 말과 글에서 문명이 시작되고, 그 생각과 사고를 기록한 글들을 모은 장소가 책이다. 그런 인간의 일면이 담긴 책을 파쇄한 종이를 다양한 입체작업으로 승화시킨 박종태 작가의 작품들에는, 마치 우주의 별이 생을 다해 성운으로 흘러가 순환을 거쳐 별로 태어나는 과정과, 해변의 바위가 무너져 모래가 되어 바다를 떠돌다 다시 해변에 도착하는 과정을 연상케 하는 무언가가 있다. 구체적인 형상도 규칙도 없이 프레임 안에 들어 있는 작품을 통해 내면의 깊은 생각을 끌어내는 박 작가. 그의 ‘종이만지기’ 작업을 통해 우리는 책과 인쇄물의 새로운 모습과, 각자가 갖고 있는 글자의 의미와 내면 깊은 곳의 자화상을 보게 될 것이다.
확산이라는 이름의 ‘파쇄’, 창작의 두 번째 이름은 ‘응집’, 이들을 모아 새로 창조하다
박종태 작가는 지난 5월 <심연(深淵)에서 유(遊)>전에서 보이듯, ‘깊은 연못에서 놀자’는 의미로 단순화되며 손이 많이 가는 평면작업을 하고 있다. 박 작가가 일명 ‘종이만지기’라 부르는 이 작업은 창조의 전제 조건인 파쇄와 해체로 인쇄물과 책을 종잇조각 더미로 만든 뒤, 먹과 수성물감을 섞어 수성접착제로 패널 위에 손자욱을 남기며 덮고 쌓아올려 만든다. 종이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지식과 정보를 얹고 있는 물질인데, 박 작가는 그 종이 위의 글씨를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흐트러뜨리며 지식에 대한 일종의 관념 허물기를 시도한다.
지식의 흔적을 다른 관점에서 겹겹이 붙여 새로운 형태로 만듦으로써, 폐기된 종이라는 오브제는 단색조로 통일된 프레임 안에서 응집된다. 그래서 종이는 변형을 거치고 돌아와 마음 속 심연의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는 크고 깊은 연못이 되었다. 박 작가는 이 ‘종이만지기’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일 뿐 아니라, 멀리서 보면 미니멀 조형미술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색의 형형한 기운과 날선 촉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희미하게나마 한때는 책이었음을 알려주는 오브제 사이의 글씨 파편을 눈으로 되짚어 보는 동안, 불규칙적으로 붙여 올린 노동의 강도와 정신적인 질량을 마치 지층이 쌓여가는 것처럼 표현한 이 작품들은 마음 속 심연과의 대화를 충동질한다.
의도적인 파괴와 재차 엮음이 반복되면서, 원래 기교를 넣지 않은 이 반복적 행위는 관성처럼 작품에 쌓인다. 따라서 박 작가는 작품 하나하나를 일종의 구도자 행위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메시지조차 담지 않고 유유히 고여 있는 연못은 돌 하나로도 예상 못한 파장이 인다. 그렇기에 박 작가의 작품을 마주하며 관객이 내면의 생각을 하나둘 끄집어 낼 때가 바로 작품이 완성된 순간이며, 활자와 철학이 부서져 공간을 재구축하는 행위로 책은 부활하는 것이다. 또한 전시장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것도 생각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각양각색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지식의 단편인 책의 화석으로 이룬 종이연못의 정경
학창시절 사회과학이론과 현실참여의식 사이에서 고민했던 박 작가는 그 젊음의 흔적이자 당시 배웠던 사회과학 서적의 새로운 일면을 발견하고자 파쇄로부터 재창조의 의미를 찾았다고 한다. 무릇 책과 내지라는 소재는, 작가가 의도를 넣기 이전에도 과학적인 근거나 지적 사유가 이미 글자로 적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부수고 흔적을 모아 새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명상의 준비단계와 비슷하다고 한다. 명상에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생각 외로 단순화된 작품을 반복해 만드는 고행으로 얻는 만족감이 있기에, 관객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면 채우기보다는 우선 작가의 생각을 절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렇게 만든 지층의 연못에 견고하게 굳어 간 ‘책의 화석’은 존재 자체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내면에서 떠올리거나 발견하게 만든다. 박 작가는 작가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깨달음 중 하나가 소장한 책들을 오브제로 사용하고, 원래 쓰던 재료를 바꾸게 된 것이라고 덧붙인다. 어느 날, 종이를 조각내고 붙이는 작업을 하던 박 작가는, 접착제의 독성이 침투되어 관상수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창조행위가 오히려 절멸과 폐기물을 양산한다는 모순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재료들에 화공제품을 절제하게 되었으며 접착제도 수성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자연건조로 수백 년 이상은 족히 버틸 단단한 재질로 만든 박 작가의 작품들에서 연약하고 잘 찢어지는 종이의 원래 모습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마치 심연의 깊이처럼 초기보다 도색이 진해졌고, 소조와 공예를 빌린 평면예술이라는 파격성, 동양의 먹으로 표현한 서양의 미니멀 아트라는 특징 덕분에 박 작가의 작품들은 21세기에 디지털 매체를 두고 대치상태인 책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현했다는 평을 받는다.
제 24회 스위스 ABB홀 550에서 개최된 ‘쿤스트19 취리히’ 아트페어에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참가한 박 작가는 이 아트페어에 스위스 미술매체인 <INEWS>의 추천을 받아 향후 신작의 해외전 전망이 밝다. 30x20크기나 10호-30호 규모로 제작하기도 하는 박 작가는 당분간 평면작업을 계속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입체작을 시도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 2020년 2월 20-23일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 38회 한국화랑미술제, 그리고 9월 제 19회 KIAF 참가가 확정된 박 작가는 어떤 철학과 관념을 완성했다기보다는 예술로 완성해 가는 단계이며, 관객들도 작품을 통해 사유하며 새로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