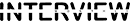“너 자신을 알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나면, 수명이 있는 인간은 운명론과 허무주의에 빠진다. 삶이 팍팍한 이들은 “어차피 끝낼 운명이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자”는 반출생주의로 응답하지만, 조각가 김기엽 작가는 이 담론에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를 주제로 들어 소멸론 대신 유존재와 무존재 사이의 영역인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본다. 어떤 명제는 무(無)조차도 성립 직후 존재로 전환한다는 역설이 숨겨져, ‘무의미를 조합해 만든 유의미의 과정’으로 조형될 수 있는 것이다. 종이로 전환된 나무의 삶이 구겨진 종이로 귀결되지만, 그 종이의 속재료는 나무 혹은 스티로폼임이 흥미롭고, 작가의 정성들인 손길로 전시장에 오면서 가치가 다시 정립된다는 역설로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 서 있는 그의 작품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자.
착시와 부활의 공존, 한 때 생물이었던 나무의 향기를 기억하기를
개인전 <경계를 보다>와 2022년 12월 갤러리 더플러스 선정작가로서 선보인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로, 조각가 김기엽 작가는 그의 페르소나인 <의미 없는 덩어리> 연작의 서로 다른 의미를 논하고 있다. 그는 사용 후 가치를 잃는 존재를 메타포로 삼아 오브제를 다루는 조형예술가다. 예술가는 질문의 문법을 물음표보다는 마침표로 사용하여 오히려 더 큰 담론과 화두의 여지를 남긴다. 김 작가의 경우는 그가 제시한 질문이 바로 존재의 ‘의미’ 이자 ‘경계’로서, 마침표 뿐 아니라 쉼표를 연이어 찍었기 때문에 눈길을 끈다. 이 주제에 생각할 여지가 있는 이유는 그가 인체를 조형하다 인간-자연의 종속관계와 유사한, 자연/인간이 소모품으로 만든 물건을 통해 작품의 소재를 오브제는 물론 질문의 텍스트로까지 확장하기 때문이다.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를 통해 그는 무의미한 형상들을 덤덤히 보여주고 있으나, 그의 소재와 작법은 가치를 잃은 물건들의 배후와 대과거를 통해 인식의 변화, 상대성 이론 같은 시점의 변화를 역설한다. 한 때는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린 의미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인식의 프레임이 바뀌는 경계에 시선이 닿으면, 숨은 가치가 재정립되며 이 착시효과가 의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김 작가는 <의미 없는 덩어리들>이라는 평범한 명제의 시작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창조되어 무로 돌아가는 종속적 순환 이치라 설정하고 고찰하기 시작한다. 또 구겨져 덩어리진 스케치북 습작의 현재가 ‘무의미’라면, 혼합소재와 나무로 형상을 유사하게 재현해 작품이 된 상황은 ‘의미’다. 여기에는 “인간도 자연이 보낸 소포와 같아서, 나무재료 종이꾸러미 형상인 <From>, <Invisible 1,2>에는 내면에 무엇이 담겼는지 상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작가의 담론까지도 곱게 밀봉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종이쇼핑백 형상에 나이테 결을 재현해, 나무가 종이, 종이백, 폐품처럼 가치를 다한 후 전이될 상황을 인간사로 보는 감성도 있다. 그는 “나무는 돌, 금속재료와 달리 무생물 전에는 생명이었다. 목재가 나무의 진액이 머물던 시절처럼 고유의 향기를 갖고 있듯이”라며, 재료의 죽음을 강조해 삶을 부활시킴에 따라 예술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입증하고, 일련의 담론에 진짜 결론의 마침표를 찍는다.
빙산의 일각, 꽃다발처럼 대중성 갖춘 ‘버려진 소재’도 찾아 내
인간은 자연이 창조했지만 소멸될 운명이기에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 든다. 그래서 인간은 예술을 이뤄냈고, 이 필연적인 소멸의 운명 앞에서 김 작가는 어떤 마침표가 더 설득력 있는지 결과보다 과정을 나타내는 것에 힘쓴다. 인체묘사를 거쳐 자연 속 인간의 속성을 암시하는 사물로 바뀌는 김 작가의 형상 시그니처 묘사도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는 원목에 직접 새기기보다 합판을 겹겹이 붙여 나이테를 표현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처럼 합판을 붙여 원목으로 만든 오브제로 인체형상을 조각해 나가며 인공 속의 자연물, 무로부터 유의 존재감을 만들어 간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어 부활시키는 나이테 작업은, 태어남의 노고처럼 그냥 원목을 깎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다. 이는 그의 신념인 “작품은 물건이라는 결과물이 아닌 의미 자체다”에 적합하며, 그가 소모품, 폐기된 것을 보며 작품의 주제를 떠올리게 된 변화를 충분히 납득하게끔 한다. 그의 인체 묘사에는 나무와 사람의 두상의 공통요소를 한 데 모은 <심연>처럼 살아있음의 가치를 강조하는 작품도 있으며, 나무라는 생과 사가 공존하는 무생물에 입혀진 생명의 이미지는 명멸의 이치와 죽음, 소멸, 부활의 과정을 능히 재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김 작가의 담론은 상실 단계에 머무는 대신, 다시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머물 법한 ‘시간의 지평선’ 혹은 ‘경계에 있는 삶의 담론’으로 들어온다. 또한 소재에서도 변화가 보이는데, 구겨지고 뭉쳐진 종이를 나타내는 소재와 질감 모두 더욱 공들여 <의미 없는 덩어리>도 자연 그대로의 갱지색 외에 흰 스티로폼 소재를 섞어 더 진짜다운 종이뭉치 형상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김 작가는 폐기물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그의 자연친화 성향답게 쓰레기를 양산하기 싫어 다작보다 하나하나 공들여 소량제작을 하는 편이며 모티브도 오랜 상상과 숙고를 거쳐 얻는 편이다. 그래서 소재의 디테일함을 눈으로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경계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선택권의 다른 의미일 수도 있으며 그가 생과 사, 의미와 무의미, 물건과 폐기물 사이에 있는 재활용의 대명사 ‘캔’을 소재로 삼은 이유도 알 수 있다. 버려진 것에서 질감과 쓰임새를 동시에 성찰해 냈기에, 그는 신작에서 다면성과 일각의 모순이라는 요소가 있는 ‘빙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소멸하는 것을 더 보편적으로 상징하는 ‘꽃다발’ 같은 주제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 작가의 일상에서 온 무의미와 존재가치의 경계, 그리고 발상의 전환은 어디까지 전개될지 몹시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