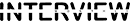정치적으로는 엘리트주의, 그러나 예술에서는 대중론을 추구했으며 “반복되는 것만큼 가치 없는 예술은 없다”고 정의한 문화인문학자 가세트의 일갈에 따르면, 반복은 정체이자 답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모노크롬,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소재의 중첩과 반복된 나열, 설명 부재가 미덕인 미니멀리즘 아트는 그런 의견에 대항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허나, 여기 작가의 원초적 손맛이 만든 미니멀한 씨앗들이 생명을 틔우고, 터럭이 돋아나며, 이내 형태를 갖추고 헤엄치는 <심연에서 유>의 연장선 격인 박종태 작가의 5회 개인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문명의 정보가 담긴 책의 종이를 파쇄하고 가공해 새로운 오브제로 만들어 냈던 박 작가가 이번에는 사각 프레임도 종이처럼 해체하고 패널 위에 재구성해, 작품에 공간이라는 훌륭한 둥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간 심연을 유영하던 작품들은 수중의 급작스런 감압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심해어들처럼, 열린 공간에 나와 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허공과 벽으로, 정맥과 동맥처럼 넘나들며 상호작용하는 종이가루 화석들의 군집과 단편들
미니멀 아트는 형태와 색을 최대한 단순화한 추상예술이다. 내성적인 자기표현에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한 작법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품을 들여 규격과 형태의 각을 잡고 선과 면, 구형을 형성하기에 즉흥성과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반복과 연속으로 의미를 갖는 오브제들은 특유의 표면장력으로 중심을 향해 안으로 긴장감을 보이는 내향성인지라, 모노미니멀이 추구하는 본질 찾기를 하다 자칫 마이크론으로 지향함을 염려한 작가들은 어떠한 이즘(ISM)을 자신의 미니멀 아트에서 강요하지 않는다.
책을 분해해 종이가루를 수없이 다루며 관성처럼 체득한 어떤 자연스러움 덕분에, 이제는 평정심을 넘어 거칠고 입체적인 아우라를 보이는 박종태 작가의 작품들도 평범한 사각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는 최근 들어 사각 틀을 쪼개고 더 많은 양식으로 오브제들을 제작한 <심연에서 유>의 두 번째 테마를 선보였다.
벽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고 사각 틀에서 한결 자유로워진 이번 전시는 큰 오브제, 물고기들의 삼각 군집과 각진 샬레에 갇힌 오브제의 세포 토막처럼 작고 푸른 조각들의 조형이 벽면을 가로지르고, 다른 조형물들과 대조되는 적갈색의 구형 3개가 매달린 입체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흰 종이에서 지식과 문명의 요소를 찢어내 잘 뭉쳐둔 박 작가는, 설치미술 공간이라는 흰 무대에서 고대 유물처럼 모노톤으로 잠들었던 화석 사이에 끈질기게 돋아 난 이끼 같은 촉감으로 각각의 오브제들을 구현했다. 주목할 것은 대치상태인 청과 적갈 사이의 검정인데, 반듯한 조형물 속에 있는 박 작가의 검정은 색면추상화, 특히 에드 라인하르트의 검정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선(仙)’의 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벽면에 돌출된 각각의 색들은 마주보는 오브제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흰 배경 빛 속에 숨겨졌다가 머리를 드러낸 것처럼 보인다. 심연에서 트인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 고적한 심해의 죽음과도 같은 검정에서 검은 터럭이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듯 세포처럼 증식해, 표면은 이글거리면서 프러시안블루 빛 정맥으로 헤엄쳐 가고, 동맥 속의 적갈색 빛 적혈구처럼 혈관을 들썩이며 형태를 바꾼다.
종이만지기가 남긴 자국, 벽과 공간을 활용해 심연(深淵)에서 지상으로 떠오른 유영(遊泳)
제이원 갤러리와의 협력을 거쳐, 박 작가는 기존에 진행된 작품의 양식과 형식을 벗어나 심플&모노 스타일이었던 심연의 명도와 채도에 더 생생한 스펙트럼과 질감을 더하게 되었다.
빛에 따라 수십 가지의 청, 적, 흑을 만들고 강렬한 요철, 미묘한 대비를 만들어 낸 조형물들은 바닷말 혹은 심해 화산폭발의 흔적처럼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좋은 무대를 다재다능한 역할로 빛내는 배우로 채운 듯 공간과 벽면의 조형성에서 온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벽면과 공간의 조형물들이 상호작용을 이루며 지상으로 떠오른 자유를 갈망하는 이번 <심연에서 유> 전시에서, 박 작가의 종이만지기 공예는 마치 축구장의 잔디를 푹 퍼내 가공한 듯 거칠면서도 다채로워졌으며, 조명에 따라 하나의 색도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다른 채도로 느껴진다.
손맛이 생생한 단독, 혹은 군집된 이 수십 가지 조형물들은 관객들에게 각자의 세계관 안으로 찾아 들어가도록 하며, 평면 위의 입체를 더 다양하게 나타내고 공중에 매달린 오브제들은 화면에 머물렀던 첫 번째 <심연에서의 유>보다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상징한다. 그리고 배경과 적당한 조명 덕분에, 태양의 홍염처럼 날뛰는 표면 속에서 검정을 마주한 적갈색은 숨겨둔 마방진 같은 큐브의 요철을 내비치기도 한다.
박 작가는 물방울 같으면서도 서로 크기가 달라 날짐승의 발볼록살을 닮은 벽면의 원, 그리고 푸른 사다리꼴 4개의 모래시계 형 밸런스를 지나 발자국의 군집 같고 바다의 정어리 떼들처럼 36-13-7의 배열로 모인 청색의 작은 조형물들을 눈으로 좇는 동안 공간이 배경으로 어떻게 작용하며, 작가가 직접 제시하지 않는 메시지를 각자의 내면에서 어떻게든 자유롭게 느끼기를 바란다고 한다.
미니멀이란 상상의 여지를 두고 의미를 정의하지 않기에 공(空)의 영역이 얼마나 큰 지를 역설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 복잡한 표면의 단색을 작품에 입히는 실험을 마친 박 작가는 지난해 제 24회 쿤스트 아트페어에서 저명한 스위스 갤러리와 현지 미술매체인 <INEWS>의 추천으로 한국 미니멀 아트 조형의 내공 수준과 밝은 미래를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의 일정으로 2월 코엑스 화랑미술제를 택한 박 작가는 9월 KIAF아트페어, 그리고 부산아트쇼를 비롯한 국내외 페어에 참가할 예정이며, 유럽 전시 역시 준비 중에 있다. 그는 손으로 만져 몸으로 체득한 이 자연스러운 펼침과 유(遊)하는 산물들의 변화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